L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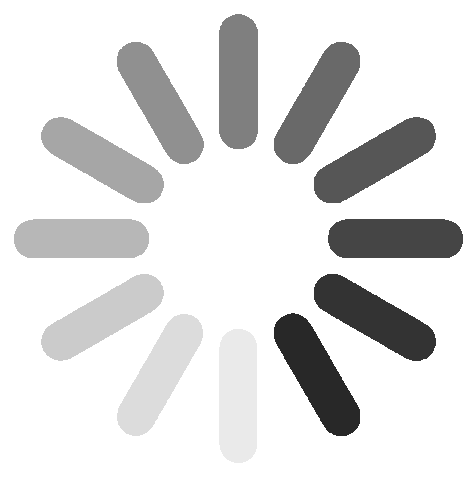
Edit Post

(사진 변경은 최소한으로 부탁드립니다)

Anonymous User
팔로우
40분을 기다려 받은 명란구이. 둘이 운영하는 가게라 늦을 수 있다는 문구를 메뉴판에서 읽었다는 일행의 말을 믿고 꾹꾹 기다렸다.
노심초사하며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울즘 마주한 접시. 가지런한 오이와 명란을 썬 후 토치로 지진 디테일에 한 번, 맛에 한 번, 끓는 점까지 도달할 뻔한 인내심이 온도를 찾아갔다.
‘최강록 쉐프 같은 분인가봐.‘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을 빗대니 오히려 기분이 맥주 거품처럼 파라락 떠올랐다.
그제서 본 메뉴판. 둘이 운영한다는 말은 있지만 늦음에 대한 말은 없었다. 일행이 만들어낸 독해력 덕에 조금 더 버텼고 결국은 맛있는 장소로 기억할 것이다. 단, 시간이 넉넉할 때 방문할.
#인내심
134일 전
< 이전글
스마트폰 화면을 좌우로 슬라이드 해보세요!
다음글 >
4
1
 님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님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