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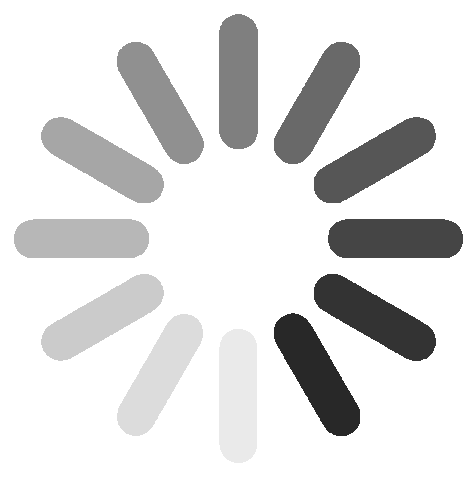
Edit Post

(사진 변경은 최소한으로 부탁드립니다)

Anonymous User
팔로우
김영민 교수의 책을 사고 받았던(추가로 포인트를 써야 하긴 했다) 디저트 접시. 지금도 요긴하게 쓴다. 접시의 크기는 밥그릇으로 쓰기에도 국그릇으로 쓰기에도 애매하다. 반찬을 담을 수는 있겠지만, 저 문구를 딱 보고 나면 다른 그릇에 반찬을 담게 된다.
디저트를 담으면 그릇의 문구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다 디저트를 다 먹고 나면 다시 문구가 보인다. 맛없는 디저트를 먹기에 인생이 너무 짧다. 디저트를 먹기 전에도 먹고 나서도 절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문장. 요런 문장 하나 짓고 싶다.
#디저트
#그릇
#문장
133일 전
< 이전글
스마트폰 화면을 좌우로 슬라이드 해보세요!
다음글 >
3
1
1
 님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님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