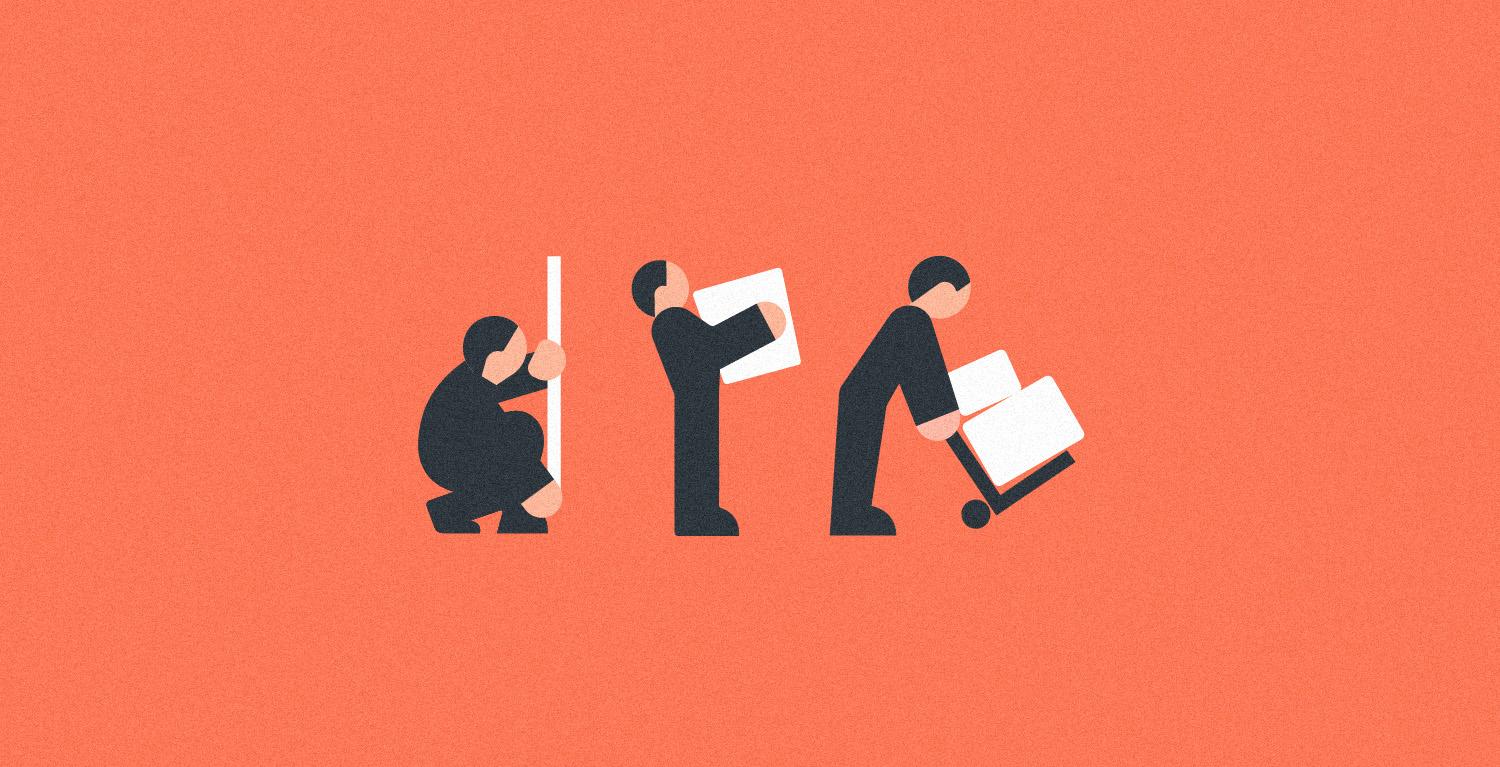LIKE❤️

요즘 꽤 긴 시간동안 회사를 쉬면서 여러 분야 책을 읽었다. 친구네 집에서 들고 온 <진중권의 테크노 인문학의 구상>(2016)도 꽤 흥미롭게 읽은 책이다. 인문학의 위기,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에 대해 논하고 있는 책이지만, 나에게는 저널리즘의 위기,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에 대한 책으로 읽혔다.
저널리즘, 그 중에서도 '신문의 위기'는 인문학 위기론처럼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3년 전쯤인가 '신문의 날'을 맞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부모님이 아침마다 신문을 본다는 아이가 두 반 합쳐서 1명밖에 없었다.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위태로워 보였다.
그럼에도 내가 신문 저널리즘에 미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디지털세상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 정보의 홍수는 정제되고 검증된 뉴스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본 딥페이크 다큐는 충격적이었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가짜'는 분야를 막론하고 더 쏟아질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는 당연하게도 신문 저널리즘에 대한 수요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저널리즘의 위기는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에 대한 언론사들의 잘못된 이해가 만드는 듯하다. 이 책이 말하는 것도 디지털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화가 만든 새로운 의식 흐름, 변화한 자본주의 소비 행태이다. 미학자답게 이를 '미적자본주의'라고 설명하는데, 쉽게 말해 소비재의 사용가치보다 디자인 같은 미학적 가치가 더욱 중시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다.
나는 미적자본주의든, 기호자본주의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자본주의의 새물결 안에는 '내러티브'가 있다고 본다. 상품의 경제성보다 상품에 담겨 있는 어떤 '스토리'에 소비자들이 더 크게 감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책이 예시로 드는, 게이미피케이션이나 호모루덴스 같은 것도 잘 따져보면 그 안에 숨은 스토리, 내러티브에 반응하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내러티브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언어가, 기록이,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인류와 함께였다. 그럼에도 지금 내러티브가 주목되는 것은, 이를 폭넓게 받아들일 만한 거대한 여유가, 물질적 토대가 어느정도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다. 좋든 나쁘든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가 먹고 살기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낸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언론사들, 특히 신문사들은 대부분 전후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이란 단어에 사로잡힌 바람에 기사를 내는 '속도'와 '양'에만 집착하고 있다. 신문이라는 아날로그 질서에 오래 복무하고 있었기에, 그 반대급부로 디지털을 막연히 좋은 것, 세련된 것, 따라가야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신문을 버리겠다는 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시대를 잘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독자, 그러니까 새로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개인이 감응할 수 있는 미학적 기사, 내러티브가 담긴 기사를 연구하고 써도 모자랄 판에 신문사들은 자기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강점도 잊은채 자극적인 제목 뽑기, 쓸데 없는 단독, 속보 쓰기에만 눈이 돌아가 있다. 디지털 시대를 오독(誤讀)한 탓이다.
2020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