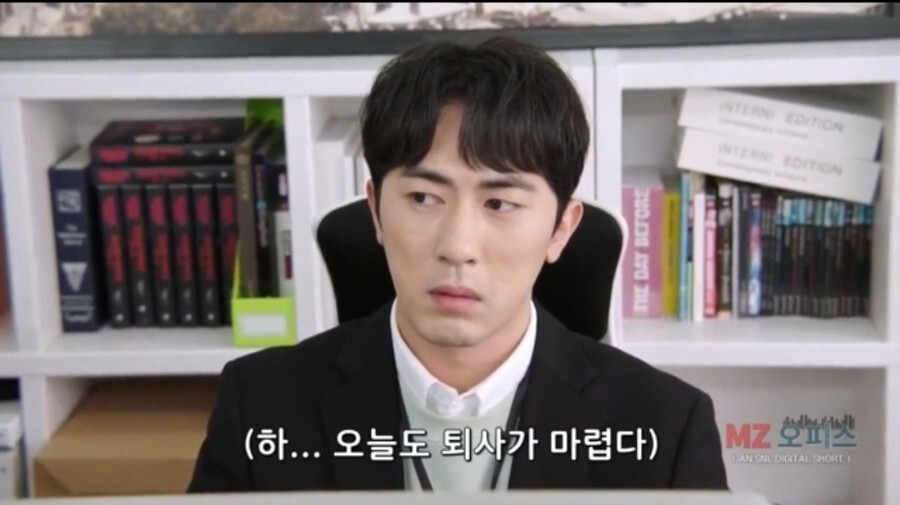LIKE❤️

비 내리는 동거차도
“그거요? 우리는 맛 몰라요. 잠들려고, 그거 없으면 못 자요. 가슴이 답답해서….”
세월이 흘렀지만 ‘남겨진 이’는 ‘떠나간 이’를 묻지 못했다.
지난 6일 팽목항에서 하루에 한 번 있는 배편으로 3시간 걸려 도착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늘이 어두워졌다. 우중충해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뚫고 노란리본을 따라 산비탈을 20여분 오르자 움막이 하나 있었다. 지난해 9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만든 것이다.
‘후두둑.’ 어느새 굵어진 빗방울이 움막을 때리기 시작했다. 연신 춥다며 모포를 싸매던 ‘성호 아빠’ 최경덕(46)씨가 소주 3병을 ‘약’이라며 구석으로 밀었다. 최씨에게 소주는 약이었다. 최씨를 비롯해 아버지 3명은 “술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9.9㎡(3평) 남짓인 움막 안에 빈 술병, 먹고 난 컵라면 용기, 담배 꽁초가 수북했다.
비 섞인 바닷 바람이 쉴 새 없이 움막을 때렸다. 기울어진 땅 위에 얼기설기 만든 움막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방송사 취재진이 임시로 만든 천막 뼈대를 재활용해 천과 비닐을 얹어 만든 것이다. 움막 밖을 빼꼼 내다보는 망원렌즈에서 참사현장까지 거리는 2.7㎞ 남짓.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구난구조회사인 ‘상하이 샐비지’가 시작한 세월호 인양과정을 영상과 메모로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7개월 동안 반별로 3~4명씩 팀을 구성해 1주일씩 교대로 이곳을 지키고 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추위는 매서웠다. 비탈진 지반 탓에 잠자리는 불편했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다. 아빠들은 컵라면과 통조림으로 끼니를 때웠고 근처에서 따온 달래와 고추장을 넣어 끓인 찌개가 안주였다. 씻는 것은 언감생심,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썼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 자신들의 삶을 집어삼킨 ‘진실’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양 무릎과 허리가 불편한 ‘하용이 아빠’ 빈운종(47)씨가 기를 쓰고 지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동안 세월호 유족들은 인양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분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진행된 세월호 2차 청문회에서도 이점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다. 이들이 눈을 번뜩이고 망원렌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정부와 주무 부처가 보여준 태도 때문이라고 했다.
빈씨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유족을 인양 작업 과정에서 뺐다. 작업 상황을 통보하듯 고지하니 유족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두명이라도 작업 현장에 참여했다면 이렇게까지 불신하진 않을 것”이라고 한숨을 토했다. 옆에서 카메라를 지켜보던 ‘승묵이 아빠’ 강병길(49)씨도 “2년이 지나도록 변한 것이라곤 대중의 시선 뿐”이라며 “‘가족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6시58분, 중국 바지선 예인선 좌측으로 이탈.”
녹슨 캠핑의자에 앉아 수시간째 망원 카메라를 지켜보던 승묵이 아빠가 침묵을 깼다. 춥다며 몸을 부르르 떨던 성호 아빠는 옆에서 ‘동거차도 일일상황보고’를 꺼내 들은 내용을 꾹꾹 눌러 적었다. 그가 꺼내든 일지에는 배들의 사소한 움직임 등 세월호 인양 작업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기록은 이어졌다. 아빠들이 눈의 실핏줄이 터지도록 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것이 먼저 떠난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인지, 반대편에서만 작업을 한다”며 “자료를 모아 세월호 인양 이후 인양 작업에 대한 검증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동거차도 앞 바다는 고통스러운 장소다. 움막을 지키는 최씨는 온 종일 태블릿PC 속 아들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벌써 수천, 수만번은 봤을 법한 사진이지만 최씨는 쉴새 없이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늘였다 줄였다’를 반복했다. 움막에 있던 다른 아빠들은 그런 최씨에게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저는 아이가 하나였거든요, 거참 미안해하지 말라니까…. 아이가 사진 찍는 걸 싫어했어요. 그 나이 또래가 원래 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같이 찍고 그랬던 사진들이예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어스름이 깔리고 비는 폭우로 변했다. 최씨가 젖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이들이 수학여행 출발 바로 전에 벚꽃나무 아래서 단체로 사진을 찍었어요. 봄이 되면 그 모습이 떠올라요. 다른 것은 바라는 게 없어요. 딱 4월15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지 말라고, 수학여행 가지말라고 하고 싶어요. 아이 얼굴 한번만 더 보고 싶어요.”
비 내리는 동거차도 정상, 세찬 바람 사이로 담배불만 반짝였다.
2016년 4월